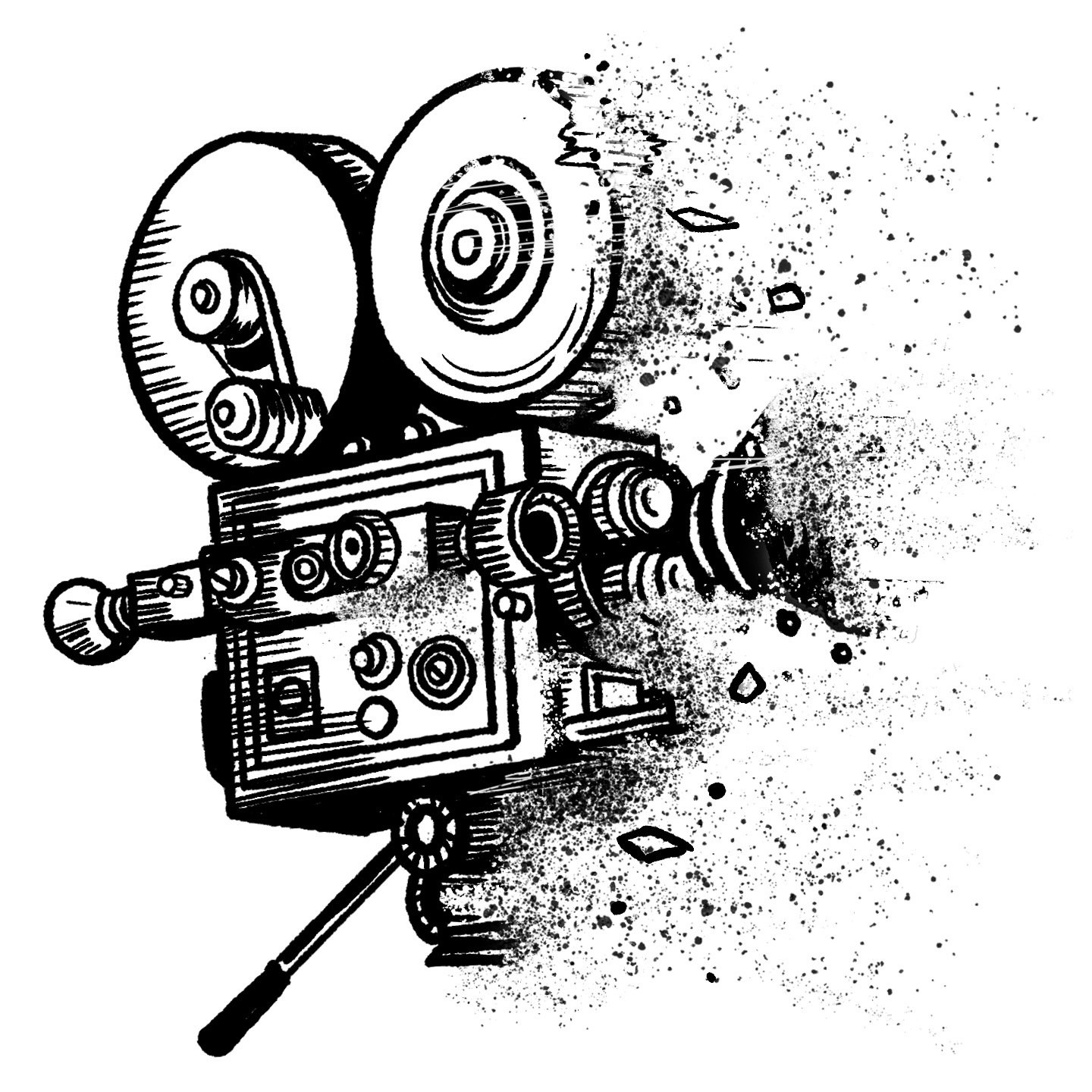추천 콘텐츠
기술의 파도 앞에 선 영화
7월 24일, explained
할리우드가 AI를 두려워한다. 영화에게 기술은 위협일까, 기회일까.
NOW THIS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의 월드 프리미어 시사회가 열린 지난 7월 13일, 배우들은 시사회 도중 집단 퇴장했다. 영화배우조합(SAG-AFTRA)과 이들의 고용자인 영화·텔레비전제작자연맹(AMPTP)의 계약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다음 날인 7월 14일, 16만 명의 할리우드 배우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에서 파생한 기술이 배우, 작가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두려움을 드러냈다.
WHY NOW
영화는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견인해 왔다. 발명 당시에는 움직이는 그림으로, 때로는 진실의 순간을 포착하는 다큐멘터리의 형태로, 최근에는 고도화된 CG를 통한 가상의 세계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 모든 변화의 순간마다 기술의 파도가 요동쳤다. AI와 딥페이크, 스트리밍은 지금의 영화가 마주한 변화의 파도다. 미래의 영화는 이 파도를 기회 삼아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

OTT의 부조리
영화배우조합이 제기한 문제 중 하나는 OTT 업체의 부조리한 욕망이었다. OTT 플랫폼으로 인해 영화관 티켓이 팔리지 않게 됐고, TV 시청 인구는 크게 줄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올해 영화 티켓 판매액은 2019년에 비해 21퍼센트 하락했다. TV를 시청하는 미국 인구는 2016년 1억 가구에서 6400만 가구로 줄었다. 콘텐츠 유통의 강자로 자리 잡은 OTT는 시즌의 에피소드 수를 줄이고, 작가의 고용을 유연화해 제작에 참여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분배금인 레지듀얼(residual)을 낮췄다. 그들이 OTT에 부조리한 욕망이라는 수식을 붙인 이유다. 파업에 동참한 이들은 OTT 업체의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수익 보장을 주장했다.
AI 시대
임금 문제와 바로 맞닿은 OTT가 유일한 비토의 대상은 아니었다. 기술 발전의 첨단에 선 인공지능도 그 우려의 주인공이었다. 배우와 작가 조합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초상권 침해, 생성형 AI로 인한 창작 윤리의 문제를 제기했다. AMPTP는 AI를 사용할 때 배우의 디지털 초상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합은 그러한 해법이 비현실적이라 지적했다. 영화배우조합의 의장인 프랜 드래셔(Fran Drescher)는 AI가 “창조적인 직업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기계로 대체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 주장했다.
영화의 시작
이들의 우려는 설득력 있다. 이미 기술의 발전은 영화의 많은 것을 바꾸고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그 시작부터 그랬다. 현대적 의미의 ‘영화(cinema)’를 만들었다 평가받는 뤼미에르 형제는 1895년, 영사 도구인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한다. 관객은 파리의 그랑카페에 모여 영사된 영화를 최초로 감상했다. 그런데 뤼미에르 형제 이전에 이미 움직이는 영상을 송출하는 기술을 발명한 이가 있다. 유명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다. 1889년, 에디슨은 영상 시청 기구인 ‘키네토스코프’를 개발하는데 이는 시네마토그래프와 달리 개인형 영상 시청 도구였다. 사람들은 작은 구멍에 얼굴을 넣고 20~30초 동안 움직이는 영상을 봤다. 시대는 여럿이 모여 영사된 움직임을 관찰하는 시네마토그래프를 ‘영화’라 인정했다. 혼자서 디스플레이를 들여다보는 에디슨의 장치는 진짜 시네마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넷플릭스와 모니터로 개인의 영화를 즐기는 지금, 최초의 영화 장치는 시네마토그래프일까 키네토스코프일까?
가벼운 카메라에서 디지털 영화까지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처럼, 영화는 시대마다 크고 작은 기술적 변화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영화가 태어나거나 정의됐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활발했던 프랑스의 영화 사조 누벨바그는 기존의 새로 개발된 저렴하고 가벼운 카메라 덕에 가능했다. 감독들은 16밀리미터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고 비로소 렌즈는 꾸며지지 않은 날것의 거리를 비출 수 있었다. 이 신기술의 특성은 시스템화된 영화 산업에서 공장처럼 찍혀 나오는 영화를 거부한다는 누벨바그의 신조와도 맞닿아 있었다. 필름 영화의 소멸도 영화가 넘어온 파도 중 하나다. 2013년, 국내 유일의 필름 영화 극장이었던 ‘씨네큐브’는 영사기를 모두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며 디지털 영화로의 전환을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라 표현했다.
다시 돌아온 제임스 딘
지금 시대의 흐름은 어디를 향할까? BBC는 1955년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배우 제임스 딘이 곧 개봉 예정인 〈Back to Eden〉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고 전했다. 딥페이크와 유사한 인공지능 기술이 제임스 딘의 디지털 클론을 만든 덕분이다. 2023년의 제임스 딘은 단순히 연기만 하는 게 아닌, 가상 현실과 게임 등을 비롯한 대화형 플랫폼에서 관객과 직접 소통할 수도 있다. 이미 삶과 작품의 서사를 쌓은 역사 속 배우는 독특한 페르소나와 영향력을 갖는다. 다시 스크린에 돌아온 되살아난 배우는 실제 배우의 작지 않은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창작
인공지능 기술은 실제 영화 제작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동영상 생성 AI 전문 기업인 ‘웨인힐스브라이언트AI’는 지난 7월 6일 처음으로 생성 AI에 기반을 둔 SF 영화 제작에 나섰다며 1분 남짓의 트레일러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물론 AI 회사를 갖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구글의 비디오 생성형 인공지능 ‘페나키(Phenaki)’를 사용하면 몇 줄의 글만으로도 짧은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 번역과 더빙의 고도화와 간소화도 하나의 변화다.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배우는 더빙 없이도 전 세계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이 같은 신기술은 영화 제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미래의 영화
미래의 영화는 어떤 모습일까? 전통적인 영화의 공간이었던 영화관은 이미 새로운 파도에 대응하고 있다. CJ CGV는 고객이 각자의 취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극장을 내세웠다. 대부분의 영화제는 OTT 서비스와 제휴해 온라인 상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화제의 특성 중 하나였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일정 부분 해소된 셈이다. 디지털 미디어 연구자인 제이미 코헨(Jamie Cohen)은 미래의 영화가 비디오 게임 제작 기술을 활발히 활용할 것이라 예측했다. 게임 엔진을 활용한 CGI,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대체하는 로케이션이 그 사례다. 미래의 배우는 그린 스크린이 아닌, 이미 만들어진 가상의 영화 공간에서 연기할 수 있다. AI를 통해 초고도로 개인화된 영화를 보고 만들 수 있다. 모두가 감독이자 소비자가 된 세상이다. 기술의 파도 위에서 영화가 누릴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IT MATTERS
영화에게 있어 기술의 변화는 가까이서 보면 위협이었고, 멀리서 보면 기회였다. 기술은 영화를 바꾸지만, 기술만이 영화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기술 변화의 파도 위에 놓일 첨단의 영화는 영화관과 영화제라는 전통적 공간에, 혹은 OTT라는 플랫폼 사업자 안에만 갇히지 않는다.
미래의 관객은 애플의 비전 프로를 통해 공간 그 자체가 된 영화를 즐길 수도 있다. 자신이 소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나의 구미에 딱 맞는 영화를 뚝딱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탈중앙 SNS가 각자의 영화를 뽐내는 멀티플렉스가 될 미래도 머지않다. 이미 영화는 유사한 변화를 거쳐 왔다. 스튜디오에서 뛰쳐나와 거리로 향했던 이미지도, 수십 미터의 필름 롤이 아닌 외장 하드에 담긴 파일도 모두 그 시대를 비췄던 영화라 불린 것처럼 말이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의 월드 프리미어 시사회가 열린 지난 7월 13일, 배우들은 시사회 도중 집단 퇴장했다. 영화배우조합(SAG-AFTRA)과 이들의 고용자인 영화·텔레비전제작자연맹(AMPTP)의 계약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다음 날인 7월 14일, 16만 명의 할리우드 배우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에서 파생한 기술이 배우, 작가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두려움을 드러냈다.
WHY NOW
영화는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견인해 왔다. 발명 당시에는 움직이는 그림으로, 때로는 진실의 순간을 포착하는 다큐멘터리의 형태로, 최근에는 고도화된 CG를 통한 가상의 세계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 모든 변화의 순간마다 기술의 파도가 요동쳤다. AI와 딥페이크, 스트리밍은 지금의 영화가 마주한 변화의 파도다. 미래의 영화는 이 파도를 기회 삼아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

OTT의 부조리
영화배우조합이 제기한 문제 중 하나는 OTT 업체의 부조리한 욕망이었다. OTT 플랫폼으로 인해 영화관 티켓이 팔리지 않게 됐고, TV 시청 인구는 크게 줄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올해 영화 티켓 판매액은 2019년에 비해 21퍼센트 하락했다. TV를 시청하는 미국 인구는 2016년 1억 가구에서 6400만 가구로 줄었다. 콘텐츠 유통의 강자로 자리 잡은 OTT는 시즌의 에피소드 수를 줄이고, 작가의 고용을 유연화해 제작에 참여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분배금인 레지듀얼(residual)을 낮췄다. 그들이 OTT에 부조리한 욕망이라는 수식을 붙인 이유다. 파업에 동참한 이들은 OTT 업체의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수익 보장을 주장했다.
AI 시대
임금 문제와 바로 맞닿은 OTT가 유일한 비토의 대상은 아니었다. 기술 발전의 첨단에 선 인공지능도 그 우려의 주인공이었다. 배우와 작가 조합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초상권 침해, 생성형 AI로 인한 창작 윤리의 문제를 제기했다. AMPTP는 AI를 사용할 때 배우의 디지털 초상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합은 그러한 해법이 비현실적이라 지적했다. 영화배우조합의 의장인 프랜 드래셔(Fran Drescher)는 AI가 “창조적인 직업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기계로 대체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 주장했다.
영화의 시작
이들의 우려는 설득력 있다. 이미 기술의 발전은 영화의 많은 것을 바꾸고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그 시작부터 그랬다. 현대적 의미의 ‘영화(cinema)’를 만들었다 평가받는 뤼미에르 형제는 1895년, 영사 도구인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한다. 관객은 파리의 그랑카페에 모여 영사된 영화를 최초로 감상했다. 그런데 뤼미에르 형제 이전에 이미 움직이는 영상을 송출하는 기술을 발명한 이가 있다. 유명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다. 1889년, 에디슨은 영상 시청 기구인 ‘키네토스코프’를 개발하는데 이는 시네마토그래프와 달리 개인형 영상 시청 도구였다. 사람들은 작은 구멍에 얼굴을 넣고 20~30초 동안 움직이는 영상을 봤다. 시대는 여럿이 모여 영사된 움직임을 관찰하는 시네마토그래프를 ‘영화’라 인정했다. 혼자서 디스플레이를 들여다보는 에디슨의 장치는 진짜 시네마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넷플릭스와 모니터로 개인의 영화를 즐기는 지금, 최초의 영화 장치는 시네마토그래프일까 키네토스코프일까?
가벼운 카메라에서 디지털 영화까지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처럼, 영화는 시대마다 크고 작은 기술적 변화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영화가 태어나거나 정의됐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활발했던 프랑스의 영화 사조 누벨바그는 기존의 새로 개발된 저렴하고 가벼운 카메라 덕에 가능했다. 감독들은 16밀리미터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고 비로소 렌즈는 꾸며지지 않은 날것의 거리를 비출 수 있었다. 이 신기술의 특성은 시스템화된 영화 산업에서 공장처럼 찍혀 나오는 영화를 거부한다는 누벨바그의 신조와도 맞닿아 있었다. 필름 영화의 소멸도 영화가 넘어온 파도 중 하나다. 2013년, 국내 유일의 필름 영화 극장이었던 ‘씨네큐브’는 영사기를 모두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며 디지털 영화로의 전환을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라 표현했다.
다시 돌아온 제임스 딘
지금 시대의 흐름은 어디를 향할까? BBC는 1955년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배우 제임스 딘이 곧 개봉 예정인 〈Back to Eden〉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고 전했다. 딥페이크와 유사한 인공지능 기술이 제임스 딘의 디지털 클론을 만든 덕분이다. 2023년의 제임스 딘은 단순히 연기만 하는 게 아닌, 가상 현실과 게임 등을 비롯한 대화형 플랫폼에서 관객과 직접 소통할 수도 있다. 이미 삶과 작품의 서사를 쌓은 역사 속 배우는 독특한 페르소나와 영향력을 갖는다. 다시 스크린에 돌아온 되살아난 배우는 실제 배우의 작지 않은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창작
인공지능 기술은 실제 영화 제작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동영상 생성 AI 전문 기업인 ‘웨인힐스브라이언트AI’는 지난 7월 6일 처음으로 생성 AI에 기반을 둔 SF 영화 제작에 나섰다며 1분 남짓의 트레일러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물론 AI 회사를 갖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구글의 비디오 생성형 인공지능 ‘페나키(Phenaki)’를 사용하면 몇 줄의 글만으로도 짧은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 번역과 더빙의 고도화와 간소화도 하나의 변화다.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배우는 더빙 없이도 전 세계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이 같은 신기술은 영화 제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미래의 영화
미래의 영화는 어떤 모습일까? 전통적인 영화의 공간이었던 영화관은 이미 새로운 파도에 대응하고 있다. CJ CGV는 고객이 각자의 취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극장을 내세웠다. 대부분의 영화제는 OTT 서비스와 제휴해 온라인 상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화제의 특성 중 하나였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일정 부분 해소된 셈이다. 디지털 미디어 연구자인 제이미 코헨(Jamie Cohen)은 미래의 영화가 비디오 게임 제작 기술을 활발히 활용할 것이라 예측했다. 게임 엔진을 활용한 CGI,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대체하는 로케이션이 그 사례다. 미래의 배우는 그린 스크린이 아닌, 이미 만들어진 가상의 영화 공간에서 연기할 수 있다. AI를 통해 초고도로 개인화된 영화를 보고 만들 수 있다. 모두가 감독이자 소비자가 된 세상이다. 기술의 파도 위에서 영화가 누릴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IT MATTERS
영화에게 있어 기술의 변화는 가까이서 보면 위협이었고, 멀리서 보면 기회였다. 기술은 영화를 바꾸지만, 기술만이 영화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기술 변화의 파도 위에 놓일 첨단의 영화는 영화관과 영화제라는 전통적 공간에, 혹은 OTT라는 플랫폼 사업자 안에만 갇히지 않는다.
미래의 관객은 애플의 비전 프로를 통해 공간 그 자체가 된 영화를 즐길 수도 있다. 자신이 소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나의 구미에 딱 맞는 영화를 뚝딱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탈중앙 SNS가 각자의 영화를 뽐내는 멀티플렉스가 될 미래도 머지않다. 이미 영화는 유사한 변화를 거쳐 왔다. 스튜디오에서 뛰쳐나와 거리로 향했던 이미지도, 수십 미터의 필름 롤이 아닌 외장 하드에 담긴 파일도 모두 그 시대를 비췄던 영화라 불린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