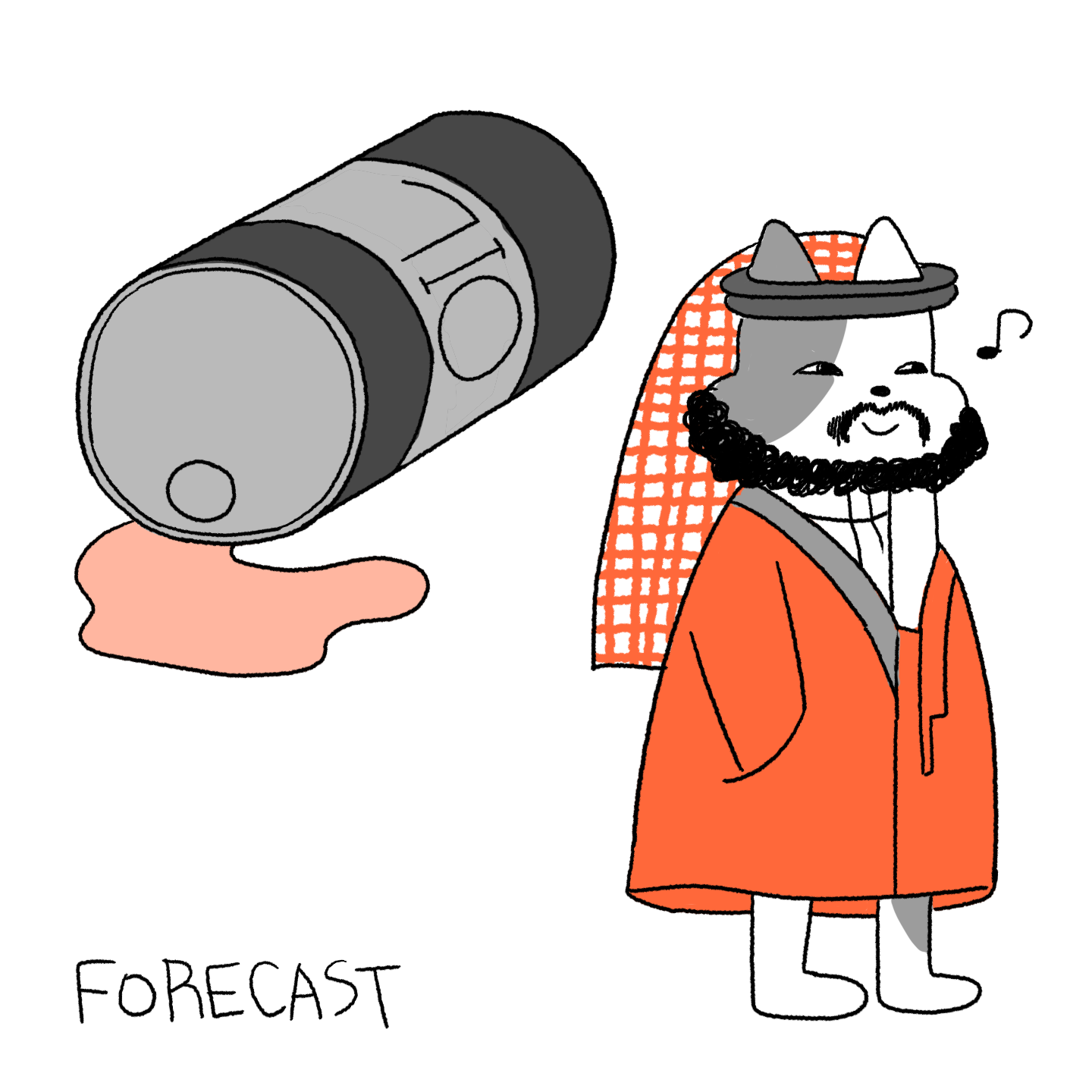추천 콘텐츠
엔드 오브 오일 머니
11월 21일 - FORECAST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형 도시 네옴 시티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꿈꾼다. 기적 같은 구상은 자원의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
-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11월 17일 방한해 네옴 시티와 관련한 수십조 원대 계약을 체결했다.
-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네옴 시티는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충격을 안겼다.
- 이 구상의 배경과 여파는 무엇인가? 사우디아라비아는 탈석유에 성공할 것인가?
DEFINITION_ NEOM CITY
NEOM | What is THE LINE? ⓒNEOM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미래형 도시 프로젝트다. ‘새로운 미래’[1]라는 의미다. 2017년 10월 24일 최초 발표됐다. 이집트·요르단·홍해를 마주한 사우디 북서부 타북주에 들어서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다. 세계 인구의 40퍼센트가 6시간 비행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다. 세 개의 신도시 계획으로 압축된다.
BACKGROUND_ 사우디 비전 2030
네옴은 일부다. 사우디의 왕세자 겸 총리 무함마드 빈 살만은 2016년 4월 15년의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네옴 시티, 수도인 리야드 남서쪽 사막 지대의 엔터테인먼트 도시 키디야(Qiddiya), 홍해 연안 관광지 개발, 사우디형 센트럴파크인 ‘킹 살만 파크’ 등 15개의 ‘기가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핵심은 탈석유, 경제 다각화다.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MONEY_ 7190억 달러
전 세계의 수주 총력전이 펼쳐지고 언론이 ‘제 2의 중동 붐’을 부르짖는 이유는 아직 수주할 것투성이기 때문이다.
RISK_ 신기루
- 트로제나(Trojena) ; 네옴의 산악 관광지다. 스키와 수상 레저 등을 제공한다. 다이버들의 낙원인 이집트의 다합(Dahab)과 마주보고 있다. ‘더 볼트(The Vault)’라는 ‘접힌 수직 마을(Folded-vertical village)’ 및 호텔과 레지던스 등이 들어선다. 2029 동계 아시안 게임을 이곳에서 열 예정이다. 2022년 3월에 발표됐다.
- 옥사곤(Oxagon) ; 네옴의 부유(浮游)식 해상 도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예측 지능, 로봇 공학 등 각종 첨단 산업이 모이게 될 복합 산업 단지로 전 세계 무역의 약 13퍼센트가 통과하는 수에즈 운하 인접 홍해에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8각형이다. 2021년 11월에 발표됐다.
- 더 라인(The Line) ; 네옴의 주거 지구다. 높이 500미터 건물 두 개가 200미터 폭으로 170킬로미터에 걸쳐 평행하게 이어진다. 도시를 일직선으로 압축해 세워놓은 친환경[2] 수직 도시로 900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탄소 제로, 자급자족[3]을 표방한다. 지하 터널을 통해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 20분 만에 도달한다. 대부분의 이동은 수직 이동이 되고 폭 역시 200미터라 차량이 필요 없다. 모든 게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있는 ‘5분 도시’다. 2021년 1월 계획이 공개됐지만 2022년 7월 비현실적인 디자인이 공식 발표되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BACKGROUND_ 사우디 비전 2030
네옴은 일부다. 사우디의 왕세자 겸 총리 무함마드 빈 살만은 2016년 4월 15년의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네옴 시티, 수도인 리야드 남서쪽 사막 지대의 엔터테인먼트 도시 키디야(Qiddiya), 홍해 연안 관광지 개발, 사우디형 센트럴파크인 ‘킹 살만 파크’ 등 15개의 ‘기가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핵심은 탈석유, 경제 다각화다.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석유 의존 해소 ; 사우디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Aramco)’를 공개(IPO)하고 수익을 국부펀드(PIF)[4]로 들인다.[5] 그 돈으로 국내외 신산업 투자를 강화하고 비석유 분야 세입을 확대한다.
- 신산업 육성 ; 관광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다양한 광업을 개발한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도 늘린다.[6]
MONEY_ 7190억 달러
전 세계의 수주 총력전이 펼쳐지고 언론이 ‘제 2의 중동 붐’을 부르짖는 이유는 아직 수주할 것투성이기 때문이다.
- 2017년에 발표한 네옴 시티의 총사업비는 5000억 달러(650조 원)지만 외부에선 그 두 배가 들 것으로 예상한다. 기가 프로젝트 전체로 넓히면 총 7190억 달러(986조 원) 규모다. 네옴은 이제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발주액이 아직 130억 달러로 전체 예상 사업 규모의 2.6퍼센트다. 기가 프로젝트 전체는 현재까지 300억 달러가 발주됐고 이는 전체 사업 규모의 5퍼센트다.
- 빈 살만은 지난 11월 17일 방한해 우리 기업들과 수십조 원대 계약을 맺고 돌아갔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미 터널 공사에 들어가며 첫 삽을 떴다. 공기(工期)는 43개월로 밭은데 그 이유는 네옴이 1차 완공으로 2025년, 최종 완공으로 2030년을 보기 때문이다.
RISK_ 신기루
사우디 초호화 미러라인, 가능하냐고요? ⓒ셜록현준
프로젝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 거울로 이뤄진 만리장성, 더 라인이다.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가 실현 가능성과 미션에 의구심을 품는다. 건축가 유현준에 따르면 500미터 높이의 건물이 폭 200미터로 양쪽에 세워지면 채광 문제가 있다. 하루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건물 상·하층의 일조권이 달라 서열화도 우려된다. 햇빛이 적으니 조감도에서 보이는 도시 내부의 식물은 자라기 어렵다. 건물 내 대부분이 인공조명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니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론 안정적 수급이 어렵다. 풍하중도 문제다. 건물이 높을수록 바람에 약하다. 멋진 조감도는 신기루일 수 있다.
RISK 2_ 그린워싱
그린워싱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우디는 국토의 90퍼센트가 사막으로 물을 대부분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하는데 이는 화석 연료로 가동되며 부산물은 해양 생태계에 해롭다. 다만 원자력을 통해 담수화를 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원자력 발전은 물을 끓여 발전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다. 원자력을 활용해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도시를 운용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만큼, 실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피가 크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소형원자로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원자력은 신재생 에너지로 보기 어렵고 애초 친환경을 표방하며 에너지 소비가 높은 것 자체가 모순이다. 미국 시더빌대학교 지질학과 톰 라이스 교수는 “네옴 시티 건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은 영국이 1년 동안 내뿜는 것의 네 배”가 될 것이라 말한다. 그린워싱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네옴은 왜 기획됐고 왜 이렇게 기획됐을까?
RECIPE_ 석유 시대의 종말
중동 국가 대부분은 산유국이며 석유를 팔아 번 ‘오일 머니’로 국가 경제를 유지했다. 사우디 역시 정부 재정의 90퍼센트를 석유 수출에 의존했다. 1970년대 중동 산유국들이 중동 전쟁을 벌이며 자원을 무기화해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도 했다. 다만 유가 인상에 대한 내부 우려도 공존했는데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당시 사우디 석유 장관이자 오일 쇼크를 주도한 아메드 야마니(Ahmed Yamani)의 말이다. “돌이 부족해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석유 시대도 석유가 고갈되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재생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의 부상 가능성을 꿰뚫어 본 격언이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의제가 부상했고 화석 연료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은 강해졌다. 거기에 미국이 2014년 석유의 대체재인 셰일 가스(Shale Gas)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산유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를 ‘셰일 혁명’이라 부른다. 2018년 기준 미국은 러시아와 사우디를 제치고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로 발돋움했다.
EFFECT_ 렌티어리즘
사우디는 1970년부터 총 열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을 실시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유는 동기 부족이다. 사우디는 이미 세입 없이 석유만 팔아도 국가가 운영되는 ‘렌티어 국가(Rentier State)’[7]였기 때문에 정권의 개혁 의지도 약했고 국민 차원의 절박함[8]도 부족했다. 이는 사우디의 노동 생산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2017년 사우디의 인적 자본 지수(Human Capital Index)는 전 세계 130개 국가 중 82위였다. 특히 제조업 역량이 매우 낮고 기반도 없다. 게다가 사우디는 왕가의 왕자들이 대부분 장관을 독차지하는 구조로, 중국의 ‘꽌시’와 같은 ‘스포크-허브(Spoke-Hub)’ 관료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부의 고른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부패가 심해질 수밖에 없던 것이다.
REFERENCE_ 두바이, 아부다비
RISK 2_ 그린워싱
그린워싱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우디는 국토의 90퍼센트가 사막으로 물을 대부분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하는데 이는 화석 연료로 가동되며 부산물은 해양 생태계에 해롭다. 다만 원자력을 통해 담수화를 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원자력 발전은 물을 끓여 발전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다. 원자력을 활용해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도시를 운용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만큼, 실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피가 크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소형원자로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원자력은 신재생 에너지로 보기 어렵고 애초 친환경을 표방하며 에너지 소비가 높은 것 자체가 모순이다. 미국 시더빌대학교 지질학과 톰 라이스 교수는 “네옴 시티 건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은 영국이 1년 동안 내뿜는 것의 네 배”가 될 것이라 말한다. 그린워싱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네옴은 왜 기획됐고 왜 이렇게 기획됐을까?
RECIPE_ 석유 시대의 종말
중동 국가 대부분은 산유국이며 석유를 팔아 번 ‘오일 머니’로 국가 경제를 유지했다. 사우디 역시 정부 재정의 90퍼센트를 석유 수출에 의존했다. 1970년대 중동 산유국들이 중동 전쟁을 벌이며 자원을 무기화해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도 했다. 다만 유가 인상에 대한 내부 우려도 공존했는데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당시 사우디 석유 장관이자 오일 쇼크를 주도한 아메드 야마니(Ahmed Yamani)의 말이다. “돌이 부족해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석유 시대도 석유가 고갈되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재생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의 부상 가능성을 꿰뚫어 본 격언이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의제가 부상했고 화석 연료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은 강해졌다. 거기에 미국이 2014년 석유의 대체재인 셰일 가스(Shale Gas)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산유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를 ‘셰일 혁명’이라 부른다. 2018년 기준 미국은 러시아와 사우디를 제치고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로 발돋움했다.
EFFECT_ 렌티어리즘
사우디는 1970년부터 총 열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을 실시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유는 동기 부족이다. 사우디는 이미 세입 없이 석유만 팔아도 국가가 운영되는 ‘렌티어 국가(Rentier State)’[7]였기 때문에 정권의 개혁 의지도 약했고 국민 차원의 절박함[8]도 부족했다. 이는 사우디의 노동 생산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2017년 사우디의 인적 자본 지수(Human Capital Index)는 전 세계 130개 국가 중 82위였다. 특히 제조업 역량이 매우 낮고 기반도 없다. 게다가 사우디는 왕가의 왕자들이 대부분 장관을 독차지하는 구조로, 중국의 ‘꽌시’와 같은 ‘스포크-허브(Spoke-Hub)’ 관료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부의 고른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부패가 심해질 수밖에 없던 것이다.
REFERENCE_ 두바이, 아부다비
How did Dubai get so rich? | CNBC Explains ⓒCNBC International
답은 신도시에 있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아랍에미리트(UAE)다.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자 두바이에 이어 아부다비까지 성공적으로 금융·무역 허브이자 관광지, 산업 단지로 탈바꿈시켰다. 많은 부분을 외국 자본에 의존해 2009년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두바이의 지리적 이점은 이를 상쇄했다. 중동은 항공기로 4시간 거리에 25억 인구, 8시간 거리에 50억 인구가 있다. 2019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연 이용객이 많은 공항 3위가 두바이였다. 이를 목도한 사우디는 더 큰 구상을 하기에 이른다. 네옴은 두바이와 달리 이집트 시나이반도(Sinai Penninsula)에 근접해 자리를 잡았다. 사우디 동북쪽에는 이라크와 이란, 동쪽에는 UAE가 있는데 서쪽엔 홍해와 아카바만이 있다. 두바이와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이라크와 이란 등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적성 국가가 없는 홍해로 자리를 잡아 네옴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KEYPLAYER_ 빈 살만
구심점엔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 더 라인의 비현실성은 빈 살만의 포부이자 절박함이다. 그는 《디 애틀랜틱(The Atlantic)》과의 인터뷰에서 네옴 프로젝트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미국이나 두바이처럼 되길 원하지 않는다.” 해당 인터뷰에서 사우디 비전 2030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그가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이유는 정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뷰전문 빈 살만은 초대 국왕이 서거하며 자신의 아버지를 국왕으로 추대하며 왕세자에 올랐다. 2017년에는 대대적으로 왕족을 숙청하기도 했다. 종교적으로 유화책을 펼치고 상징적 사업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독재자 이미지 완화를 위한 것일 수 있다. 게다가 신도시 등 건축 계획을 이용하면 리베이트 등의 방식으로 왕가 재산을 획책할 수 있다.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 도시를 친환경·스마트 시티로 기획하고, 외관은 유례없이 환상적으로 만들어 땅값을 불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
INSIGHT_ 저주와 기적
풍부한 자원은 늘 저주를 불렀다. 중앙 아시아와 중동, 서아시아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자원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렌티어리즘으로 대표되는 천수답 경제 양상을 보였고 분배가 불공평했으며 자원을 탐하는 국내외의 세력과 늘 다퉈야 했다. 종교를 제외하면 이것이 중동이 화약고가 된 주된 이유다.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필요 이상의 국방력 유지하려다 안보 딜레마가 발생한다. 두바이는 세계 경제가 거품을 향해 달려갈 때의 수혜를 입어 기적을 이뤘다. 사우디는 UAE보다 부강하지만 지금 사우디가 이루려는 기적엔 난관이 많다. 세력 균형이 불안정하고 경기는 침체 양상을 보이며 빈 살만 왕세자의 진정성과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사우디의 더 라인은 저주와 기적을 가르는 선상에 놓였다.
FORESIGHT_ 기회의 모래성
네옴 프로젝트는 빈 살만 왕세자에겐 정치적 기회, 사우디와 투자국에는 경제·기술적 기회다.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그린 수소, 푸드 테크, 우주인터넷 등 온갖 미래 기술의 상용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침체 위기의 세계 경제에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마냥 기회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낮은 실현 가능성은 건설사에 부담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10월 7일 14조 원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미수금 때문에 철수한 바 있다. 미국과 사우디의 미묘한 관계도 변수다. 지난 7월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은 OPEC의 증산을 원했던 미국과 비전 2030 투자를 원했던 사우디의 거래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사우디는 많은 이해관계가 겹치지만 최근 몇 년간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같이 크고 작은 문제로 다투는 모습이 잦아졌다.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완공된 후의 문제도 있다. 두바이는 종교적 색채가 비교적 자유로우나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의 영향이 크다. 수니파의 맹주인 만큼 음주나 카지노 등 관광 산업에 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홍보와 달리 이 기회의 장벽은 어쩌면 모래성일지도 모른다.

KEYPLAYER_ 빈 살만
구심점엔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 더 라인의 비현실성은 빈 살만의 포부이자 절박함이다. 그는 《디 애틀랜틱(The Atlantic)》과의 인터뷰에서 네옴 프로젝트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미국이나 두바이처럼 되길 원하지 않는다.” 해당 인터뷰에서 사우디 비전 2030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그가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이유는 정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뷰전문 빈 살만은 초대 국왕이 서거하며 자신의 아버지를 국왕으로 추대하며 왕세자에 올랐다. 2017년에는 대대적으로 왕족을 숙청하기도 했다. 종교적으로 유화책을 펼치고 상징적 사업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독재자 이미지 완화를 위한 것일 수 있다. 게다가 신도시 등 건축 계획을 이용하면 리베이트 등의 방식으로 왕가 재산을 획책할 수 있다.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 도시를 친환경·스마트 시티로 기획하고, 외관은 유례없이 환상적으로 만들어 땅값을 불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
INSIGHT_ 저주와 기적
풍부한 자원은 늘 저주를 불렀다. 중앙 아시아와 중동, 서아시아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자원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렌티어리즘으로 대표되는 천수답 경제 양상을 보였고 분배가 불공평했으며 자원을 탐하는 국내외의 세력과 늘 다퉈야 했다. 종교를 제외하면 이것이 중동이 화약고가 된 주된 이유다.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필요 이상의 국방력 유지하려다 안보 딜레마가 발생한다. 두바이는 세계 경제가 거품을 향해 달려갈 때의 수혜를 입어 기적을 이뤘다. 사우디는 UAE보다 부강하지만 지금 사우디가 이루려는 기적엔 난관이 많다. 세력 균형이 불안정하고 경기는 침체 양상을 보이며 빈 살만 왕세자의 진정성과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사우디의 더 라인은 저주와 기적을 가르는 선상에 놓였다.
FORESIGHT_ 기회의 모래성
네옴 프로젝트는 빈 살만 왕세자에겐 정치적 기회, 사우디와 투자국에는 경제·기술적 기회다.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그린 수소, 푸드 테크, 우주인터넷 등 온갖 미래 기술의 상용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침체 위기의 세계 경제에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마냥 기회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낮은 실현 가능성은 건설사에 부담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10월 7일 14조 원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미수금 때문에 철수한 바 있다. 미국과 사우디의 미묘한 관계도 변수다. 지난 7월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은 OPEC의 증산을 원했던 미국과 비전 2030 투자를 원했던 사우디의 거래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사우디는 많은 이해관계가 겹치지만 최근 몇 년간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같이 크고 작은 문제로 다투는 모습이 잦아졌다.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완공된 후의 문제도 있다. 두바이는 종교적 색채가 비교적 자유로우나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의 영향이 크다. 수니파의 맹주인 만큼 음주나 카지노 등 관광 산업에 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홍보와 달리 이 기회의 장벽은 어쩌면 모래성일지도 모른다.

중동 국가간 국제 관계가 궁금하다면 《중동 라이벌리즘》을, 그린워싱으로 비판받는 COP27이 궁금하다면 〈쇼는 계속되면 안 된다〉를, 중동과 서방, 중국의 화폐 패권이 궁금하다면 〈달러, 위안화... 뭘로 하시겠어요?〉를 추천합니다.
포캐스트를 읽으시면서 들었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북저널리즘을 완성합니다.
포캐스트를 읽으시면서 들었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북저널리즘을 완성합니다.
[1]
NEO-Mustaqbal. 영어와 아랍어의 조합이다.
[2]
도시의 면적이 작아 자연 대부분을 그대로 놔두기 때문이다.
[3]
스마트팜 등 수직 농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4]
Public Investment Fund. 1971년 창립된 사우디 국부펀드다. 수십년 동안 사우디 정부의 공기업 소유 지분에 대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에 그쳤으나 빈 살만 왕세자 집권 이후 2015년 3월에 왕세자 주도의 경제개발위원회(CEDA)로 감독이 이관되며 사우디 정부의 글로벌 투자 기관이 됐다. 이후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우버, 테슬라, 버진 갤럭틱, 루시드모터스 등 해외의 미래형 첨단 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한다.
[5]
아람코는 2019년 12월 사우디 증시 타다울에 기업 공개하며 전 세계 시가 총액 세계 1위를 달성했다. 11월 6일 기준 시가 총액 2조 410억 달러로 애플(2조 2010억 달러)에 이어 2위다. 여기서 5퍼센트가량의 지분을 매각해 발생한 1000억 달러가량을 PIF로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6]
아람코는 지난 8월 8일 세계 최초로 블루 수소와 블루 암모니아 인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7]
렌티어리즘(Rentierism)은 어떤 정부가 외국 개인이나 기업, 정부가 지불한 지대(Rent)로 국가의 수입 전부나 상당 부분을 얻는 것을 말한다. 석유에 대한 접근권을 독점하여 그 수익을 챙긴다는 의미다. 하젬(Hazem El Beblawi)과 자코모(Giacomo Luciani)에 의해 ‘렌티어 국가 이론(RST·Rentier State Theory)’으로 발전했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렌티어 국가는 국내 경제의 생산성 혹은 과세 능력을 높이기 어렵고 외부 수익의 불평등한 분배가 발생한다. 이는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내수 경제를 망가뜨려 빈부격차를 발생시킨다.
[8]
렌티어 심리(Rentier Mentality). 렌티어리즘에 의해 경제 혜택을 받는 데 익숙해진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