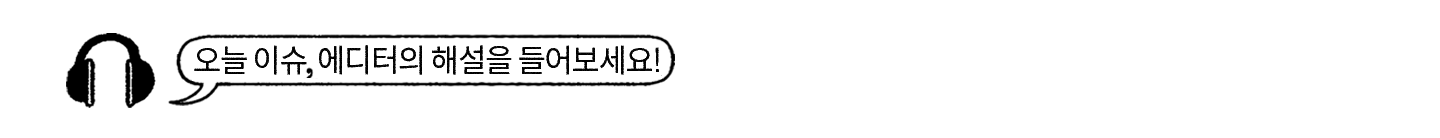추천 콘텐츠
AI 시대 생산성의 역설
2023년 9월 1일, explained
쏟아지는 업무 툴은 디지털 부채와 스크린 무호흡증을 부른다. 생산성의 시대에서 기술은 왜 리스크가 되는가?
NOW THIS
지난 8월 29일, 구글 클라우드가 콘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를 본격 출시했다. 업무 툴인 워크스페이스에 듀엣 AI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까지, AI를 결합한 업무 툴 경쟁이 가속될 전망이다.
WHY NOW
직원들은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완수하기 위해 평균 여섯 가지의 업무 툴을 사용한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업무 툴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쉼 없이 달린다. 그들의 환상처럼, 기술은 세상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디지털 부채와 스크린 무호흡증의 시대에서 업무 툴과 AI가 만들 생산성의 미래를 짚어 본다.

듀엣 AI
구글 클라우드의 이번 콘퍼런스는 전 세계인의 비즈니스에 구글의 AI를 도입시키겠다는 선포였다. 듀엣 AI는 다재다능하다. 화상 통화 중에 메모를 작성할 수 있고, 자동으로 회의를 요약해 준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회의 텍스트와 차트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 회의를 혁신할 수도 있다. 듀엣 AI는 회의실 참석자의 얼굴을 감지하고, 이들이 하는 말을 18개 언어로 자동 번역한다. 구글은 이번 발표에서 “듀엣 AI를 통해 밤새도록 붙잡아야 했던 업무를 저녁 전에 끝낼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구글은 “사용자를 돕는 AI를 10년 넘게 구현해왔고, 앞으로도 업무 효율화를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와 비즈니스
생성형 AI가 무르익은 지금, AI는 비즈니스라는 효율성과 실용성의 영역에 공격적으로 침투하고 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비관론은 힘을 잃었다. 직원들은 AI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제대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에 따르면 직원의 70퍼센트는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AI에 많은 작업을 위임할 것이라 밝혔다. 86퍼센트는 올바른 정보와 답변을 찾는 데 AI를 활용할 것이라 답했고, 76퍼센트는 AI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답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업워크 연구소의 전무이사는 생성 AI는 이제 비즈니스에서 “자동화보다는 증강”에 가까우며 AI가 워크 플로의 일부가 되리라 전망했다.
주 4일제의 꿈
직원들은 AI를 통해 번아웃 증후군에서 탈출하기를 원한다. AI는 정말로 일을 줄여줄 수 있을까? 시장의 분석은 긍정적이다. 글로벌 금융 기관 제프리스는 AI가 비즈니스에 도입된다면 주 4일제 근무가 보편화할 것이라 분석했다. MIT 역시 챗GPT를 사용하면 평균 37퍼센트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고, 골드만삭스는 생성 AI가 노동 생산성을 연간 1.5퍼센트 높일 수 있다고 봤다. 2023년 기준, 전 세계에는 434개 이상의 AI 생산성 도구가 있다. 가상 비서, 문서 작성, 코딩까지 AI는 모든 분야에 손을 뻗쳤다.
AI 툴의 범람
지난 3월, 줌(ZOOM)은 줌IQ 서비스를 통해 대화 스레드를 요약하고 아이디어를 정리,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MS의 코파일럿,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얼마 전 발표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까지 모두 AI라는 동료가 업무를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 강조한다. 문제는 속도와 양이다. 생산성을 위한 AI 툴이 너무 빨리, 많이 쏟아져 나온다. 디지털 인프라 회사 에퀴닉스(Equinix)의 CIO인 마이린드 웨글은 AI가 너무 많아 일종의 “부조종사 홍수”가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직원들은 새로운 AI 기능을 흡수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보안 위협 역시 커진다.
업무 툴이라는 업무
그럼에도 AI는 필요하다. 신기술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리라는 환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팬데믹 시기, 같은 이유로 쏟아져 나온 건 업무 툴이었다.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일정 관리부터 회의록 작성까지 워크 플로 전반을 업무 툴이 담당하게 됐다.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회사인 ‘가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해 평균 6~8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직원들은 각기 다른 기술에 대한 숙련도로 인해 동료와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고, 개인의 업무 스타일과는 잘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했다. 팬데믹 이후의 직원들은 생산성을 위한 기술에 압도당하고 있다.
토글세와 디지털 부채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의하면 직원들은 하루 평균 3600번씩 앱에서 앱으로,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로 전환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는 이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을 ‘토글세(toggling tax)’라고 지적했다. 연간 근무 시간의 9퍼센트에 달한다. 쏟아지는 이메일, 채팅, 화상 회의, 알림은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디지털 부채가 쌓인다. 지속적인 자극은 직원의 집중력을 낮추고, 그들을 끊임없는 의사결정으로 내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부채를 AI가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컨설팅 업체인 ‘마크스 그룹’의 CEO 진 마크스는 “AI는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반박했다. 진은 기술로 인해 복잡해진 결정 절차가 외려 생산성을 낮추고 있다 지적했다.
스크린 무호흡증
역사학자 루스 코완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짚었다. 가정주부는 세탁기의 발명으로 인해 더 자주 빨래했고, 직원은 메신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나치게 소통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임원이었던 린다 스톤은 메일함 앞에서 호흡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스크린 무호흡증’이다. 생산성 물신주의는 코완의 역설, 스크린 무호흡증을 가중한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일의 제1 원칙이 된다면, 기술은 필요에 따른 활용 도구가 아닌 좇아야만 하는 목적이 된다. 주객전도다. 지금 필요한 건 생산성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는 일이다. AI는 3600번의 창 전환과 토글세, 디지털 부채라는 생산성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IT MATTERS
AI를 통해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AI를 사용하는 목표, 다양한 업무 툴을 사용하는 목적을 확실히 하라 조언한다. 분명한 목적 아래 기술과 직원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오간다면, AI는 생산성의 J 커브를 더 빠르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AI를 인력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뉴욕탠던대학교의 앤 로르 파야드 교수는 AI를 조직의 일원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세 단계의 온보딩 코스를 제안했다.
빠르게 일하는 것만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직장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고, 일은 직원이 하는 것이다. 그러한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직원이 자신의 속도로,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 리즈대학교의 경제학자 스튜어트 밀스는 “챗GPT와 같은 도구가 관료적 비효율성을 자동화하는 데 그친다면 생산성은 전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반복적인 알림과 메시지, 계속된 자극과 전환에서 거리를 두고, 무엇이 장기적인 생산성을 위한 방법인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만 조직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
지난 8월 29일, 구글 클라우드가 콘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를 본격 출시했다. 업무 툴인 워크스페이스에 듀엣 AI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까지, AI를 결합한 업무 툴 경쟁이 가속될 전망이다.
WHY NOW
직원들은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완수하기 위해 평균 여섯 가지의 업무 툴을 사용한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업무 툴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쉼 없이 달린다. 그들의 환상처럼, 기술은 세상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디지털 부채와 스크린 무호흡증의 시대에서 업무 툴과 AI가 만들 생산성의 미래를 짚어 본다.

듀엣 AI
구글 클라우드의 이번 콘퍼런스는 전 세계인의 비즈니스에 구글의 AI를 도입시키겠다는 선포였다. 듀엣 AI는 다재다능하다. 화상 통화 중에 메모를 작성할 수 있고, 자동으로 회의를 요약해 준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회의 텍스트와 차트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 회의를 혁신할 수도 있다. 듀엣 AI는 회의실 참석자의 얼굴을 감지하고, 이들이 하는 말을 18개 언어로 자동 번역한다. 구글은 이번 발표에서 “듀엣 AI를 통해 밤새도록 붙잡아야 했던 업무를 저녁 전에 끝낼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구글은 “사용자를 돕는 AI를 10년 넘게 구현해왔고, 앞으로도 업무 효율화를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와 비즈니스
생성형 AI가 무르익은 지금, AI는 비즈니스라는 효율성과 실용성의 영역에 공격적으로 침투하고 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비관론은 힘을 잃었다. 직원들은 AI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제대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에 따르면 직원의 70퍼센트는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AI에 많은 작업을 위임할 것이라 밝혔다. 86퍼센트는 올바른 정보와 답변을 찾는 데 AI를 활용할 것이라 답했고, 76퍼센트는 AI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답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업워크 연구소의 전무이사는 생성 AI는 이제 비즈니스에서 “자동화보다는 증강”에 가까우며 AI가 워크 플로의 일부가 되리라 전망했다.
주 4일제의 꿈
직원들은 AI를 통해 번아웃 증후군에서 탈출하기를 원한다. AI는 정말로 일을 줄여줄 수 있을까? 시장의 분석은 긍정적이다. 글로벌 금융 기관 제프리스는 AI가 비즈니스에 도입된다면 주 4일제 근무가 보편화할 것이라 분석했다. MIT 역시 챗GPT를 사용하면 평균 37퍼센트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고, 골드만삭스는 생성 AI가 노동 생산성을 연간 1.5퍼센트 높일 수 있다고 봤다. 2023년 기준, 전 세계에는 434개 이상의 AI 생산성 도구가 있다. 가상 비서, 문서 작성, 코딩까지 AI는 모든 분야에 손을 뻗쳤다.
AI 툴의 범람
지난 3월, 줌(ZOOM)은 줌IQ 서비스를 통해 대화 스레드를 요약하고 아이디어를 정리,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MS의 코파일럿,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얼마 전 발표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까지 모두 AI라는 동료가 업무를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 강조한다. 문제는 속도와 양이다. 생산성을 위한 AI 툴이 너무 빨리, 많이 쏟아져 나온다. 디지털 인프라 회사 에퀴닉스(Equinix)의 CIO인 마이린드 웨글은 AI가 너무 많아 일종의 “부조종사 홍수”가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직원들은 새로운 AI 기능을 흡수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보안 위협 역시 커진다.
업무 툴이라는 업무
그럼에도 AI는 필요하다. 신기술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리라는 환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팬데믹 시기, 같은 이유로 쏟아져 나온 건 업무 툴이었다.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일정 관리부터 회의록 작성까지 워크 플로 전반을 업무 툴이 담당하게 됐다.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회사인 ‘가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해 평균 6~8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직원들은 각기 다른 기술에 대한 숙련도로 인해 동료와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고, 개인의 업무 스타일과는 잘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했다. 팬데믹 이후의 직원들은 생산성을 위한 기술에 압도당하고 있다.
토글세와 디지털 부채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의하면 직원들은 하루 평균 3600번씩 앱에서 앱으로,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로 전환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는 이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을 ‘토글세(toggling tax)’라고 지적했다. 연간 근무 시간의 9퍼센트에 달한다. 쏟아지는 이메일, 채팅, 화상 회의, 알림은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디지털 부채가 쌓인다. 지속적인 자극은 직원의 집중력을 낮추고, 그들을 끊임없는 의사결정으로 내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부채를 AI가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컨설팅 업체인 ‘마크스 그룹’의 CEO 진 마크스는 “AI는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반박했다. 진은 기술로 인해 복잡해진 결정 절차가 외려 생산성을 낮추고 있다 지적했다.
스크린 무호흡증
역사학자 루스 코완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짚었다. 가정주부는 세탁기의 발명으로 인해 더 자주 빨래했고, 직원은 메신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나치게 소통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임원이었던 린다 스톤은 메일함 앞에서 호흡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스크린 무호흡증’이다. 생산성 물신주의는 코완의 역설, 스크린 무호흡증을 가중한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일의 제1 원칙이 된다면, 기술은 필요에 따른 활용 도구가 아닌 좇아야만 하는 목적이 된다. 주객전도다. 지금 필요한 건 생산성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는 일이다. AI는 3600번의 창 전환과 토글세, 디지털 부채라는 생산성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IT MATTERS
AI를 통해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AI를 사용하는 목표, 다양한 업무 툴을 사용하는 목적을 확실히 하라 조언한다. 분명한 목적 아래 기술과 직원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오간다면, AI는 생산성의 J 커브를 더 빠르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AI를 인력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뉴욕탠던대학교의 앤 로르 파야드 교수는 AI를 조직의 일원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세 단계의 온보딩 코스를 제안했다.
빠르게 일하는 것만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직장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고, 일은 직원이 하는 것이다. 그러한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직원이 자신의 속도로,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 리즈대학교의 경제학자 스튜어트 밀스는 “챗GPT와 같은 도구가 관료적 비효율성을 자동화하는 데 그친다면 생산성은 전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반복적인 알림과 메시지, 계속된 자극과 전환에서 거리를 두고, 무엇이 장기적인 생산성을 위한 방법인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만 조직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